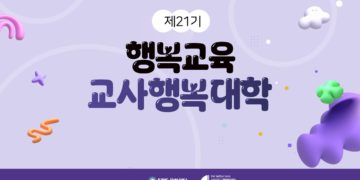목표인가? 욕망인가?
: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대상에 눈길을 보내고 다가가서 살펴보고 만져 보고 소유한다. 인간은 시각적인 존재다. 무엇인가를 보려면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목표로 삼아 눈길을 보낸다. 인간의 정신은 수렵과 채집에 길들어진 몸이라는 토대 위에 들어서 있다. 수렵은 표적을 정해서 돌멩이 같은 무기를 던져 맞히는 행위이고, 채집은 대상을 줍고 뜯는 행위다. 우리는 목표물을 향해 돌이나 창, 부메랑을 던지는 행위에 익숙하다. 둥근 링을 통과하도록 공을 던지고, 그물망을 향해 공을 때리며, 얼음판 위에 그려진 과녁으로 둥근 화강암 돌덩어리를 굴린다. 또 활과 권총, 소총과 로켓으로 표적을 향해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 던지고 쏘는 대상은 그것만이 아니다. 한턱을 쏘고, 질문을 던지고, 돈을 투자하고, 물량도 투하해야 한다. 표적을 맞히거나 점수를 올리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죄를 짓는다. 흥미롭게도 영어의 ‘죄(sin)’라는 단어의 어원은 ‘과녁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다[1].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항해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항해해야 한다[2].
우리는 언제나 ‘A’라는 지점에 있고, 동시에 ‘B’라는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때 ‘A’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점이고, ‘B’는 지금보다 더 나은 지점이다. 우리 자신뿐 아리나 이 세상 역시 불충분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늘 무엇인가를 시도한다.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낸다. 만족은 잠시 뿐이고 곧 호기심이 다시 발동한다. 현재는 부족하고 미래는 낫다는 생각,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보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상황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보려면 초점을 맞춰야 하고, 초점을 맞추려면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다는 것은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 대상 중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문제가 드러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보인다. 이런 상상을 통해 세상은 바뀌어 왔다. 엉망인 현재 상태를 미래에는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지력과 창의력은 만성적인 불안과 불만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늘 현재 상태를 목표와 비교한다. 목표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얼토당토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해 실망하거나 목표를 이루더라도 생각보다 못한 결과에 실망한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볼 것인지 잘 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로 작정한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빗나가서 죄가 될 예정인 욕망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목표든 욕망이든 일단 보기로 정하면 다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정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음을 증명한 실험이 있다. 1997년 당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던 대니얼 사이먼스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을 통해 목표와 시각의 관련성을 입증했다[3]. 사이먼스는 ‘지속적인 부주의에 의한 맹시(Sustained inattentional blindness: 사물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흔히 ‘부주의맹’으로 쓰인다)라는 심리 현상을 연구하며 몇 가지 실험을 설계했다. 먼저, 화면에 밀밭 사진을 띄우고 실험 참자가들에게 밀밭을 유심히 보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밀밭을 주시하는 동안 사진이 조금씩 바뀌었다. 밀밭 사이로 난 길이 서서히 희미하게 변한 것이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오솔길이 아니라,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길이었다. 놀랍게도 실험 대상자 대부분이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자 사이먼스는 더 대담한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다.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사이먼스는 사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한 팀에 3명씩 두 팀을 구성해 3 대 3 볼패스 게임을 하는 영상이었다[4]. 두 팀은 엘리베이터 앞 좁은 공간에서 자기 팀원끼리 공을 주고받았다. 한 팀은 흰색 셔츠을, 다른 팀은 검은 색 셔츠를 입었다. 두 팀은 멀찍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구분하기도 어렵지 않았다. 또한 6명이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가까이 찍어서 표정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먼스는 그 영상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며 흰색 팀 팀원들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세어 보라고 요구했다. 영상을 본 실험 참가자들은 대부분 15회라고 대답했다. 정답이었다. 많은 참가자가 정답을 맞혀서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실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사이먼스는 뿌듯해하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고릴라를 봤습니까?”
장난하는 건가? 고릴라라니?
어리둥절해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이먼스가 말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패스 횟수를 셀 필요는 없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가슴을 두드렸다. 고릴라만큼 큰 사람이 화면 정중앙에서 가슴을 두드리는데 알아채지 못하는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험 참가자 절반 가량이 영상을 처음 볼 때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부주의맹에 대한 사이먼스의 실험이 하나 더 남았다. 이번에는 바텐더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다. 중간에 바텐더가 뭔가를 가지러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번에도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 원래 바텐더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나라면 알아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가? 안타깝지만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바텐더의 성별이나 피부색이 바뀌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부주의맹은 인간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각이 매우 복잡한 감각이기 때문이다. 시각은 정신 생리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감각이다.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투명한 신경조직이다. 망막이 빛을 받아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시긴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망막 한가운데에 있는 중심와(황반-그래서 황반변성이 오면 실명한다)이다. 망막으로 들어온 빛은 중심와에서 초점을 맺는다. 중심와가 고해상도로 빛을 처리해 주는 덕분에 사물을 세밀하게 구별하고 얼굴과 형체 등을 인식할 수 있다.
시각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복잡하다. 중심와를 이루는 세포들이 시각 과정의 첫 단계를 처리하는데만도 시각 피질에 있는 만 개의 세포가 관여한다[5].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만 개의 세포가 추가로 필요하다. 만약 망막 전체가 중심와로 되어 있다면 뇌가 지금보다 몇 배는 커졌을 것이고, 그랬다면 인간의 모습은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을 닮았을 것이다. 따라서 뭔가를 보려면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인간의 시각이 감지하는 대부분은 주변적이고 해상도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들만 중심와가 처리한다. 목표로 삼은 대상을 고해상도로 처리하는 데 시각 능력이 집중된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진다.
관심 밖에 있던 뭔가가 얼굴을 불쑥 들이밀며 집중을 방해하면 그게 뭔지 보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이먼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중은 고릴라에 의해 깨지지 않았다. 고릴라가 현재 진행 중인 과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공에 집중하는 동안 고릴라는 다른 배경과 다를 바 없었다. 집채만 한 덩치의 유인원이 나타나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보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세계를 견뎌 낸다.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집중하며 나머지는 무시한다.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만 시선을 둔다. 그럴 방해하는 장애물은 눈에 들어오지만 그 밖의 것들은 보지 못한다.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더 많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흰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인도 문화의 기반이 되는 <베다>는 ‘인지된 세계는 겉모습이나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심오한 개념을 가르쳐 준다. <베다>에서는 이를 ‘마야(maya)’라고 한다. 인간은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녁의 목표인가? 아니면 그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욕망인가?
[1] sin이란 단어는 ‘과녁을 벗어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ἁμαρτάνειν (hamartánein) (The term hamartia derives from the Greek ἁμαρτία, from ἁμαρτάνειν hamartánein, which means “to miss the mark” or “to err”.)에서 파생되었다. 함의된 뜻으로는 판단의 오류, 치명적인 결함 등이 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amartia
[2]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MA, US: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3] Simons, D. J., & Chabris, C. F. (1999). Gorillas in our midst: Sustained inattentional blindness for dynamic events. Perception, 28(9), 1059-1074.
[4] http://www.theinvisiblegorilla.com/videos.html
[5] Azzopardi, P., & Cowey, A. (1993). Preferential representation of the fovea in the primary visual cortex. Nature, 361(6414), 719-721.
발췌: 조던 B. 피터슨(Jordan B. Peterson). 12가지 인생의 법칙(12 Rules for Life): 혼돈의 해독제. 강주헌 역. 서울, 한국: 메이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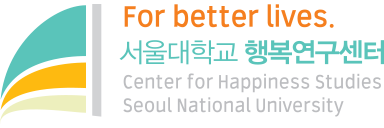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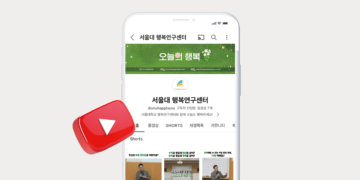

![[연구참여자 모집/사례 지급] 자유연상 패턴과 심리적 속성 간의 관계 탐색](https://happyfinder.co.kr/wp-content/uploads/2024/05/워드프레스_연구참여자모집-360x180.png)